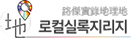로컬실록지리지

문제해결
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.
근거1
근거2
근거3
근거4
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
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, 설문조사,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
문서(hwp, doc,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)를 업로드 해주세요